
금융당국이 일부 기자들을 '털고' 있습니다.
기자 본인과 가족, 지인의 주식 계좌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속칭 '꾼'을 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주식으로 해 먹으려는 자를 쫓는 수사는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추격 대상이 전·현직 언론사 직원들입니다.
[다시 보기]
[단독]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기자 20여 명 수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6018
[단독]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 개 뒤진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7743
[단독] 기자 선행매매 혐의 수사 확대…종목·수법 더 늘 듯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8422&ref=A
■ 선행매매를 아십니까
'아, 그때 샀더라면…' 혹은 '그때 팔지 말 걸…'
SK하이닉스 주가 그래프를 보면, 적잖은 이가 이런 후회를 할 겁니다. 십분 이해되지만, 부질없는 후회기도 합니다. 주식 매매의 타이밍이란 게 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확신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습니다.
남들이 사기 전에 먼저 사들입니다. 왜? 확실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튀어 오르면 재빨리 팔고 나갑니다.
한 발 먼저 치고 빠지기, 바로 '선행매매'입니다.
다수의 기자가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가 선행매매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이 의심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파악하자 해당 주식을 매수합니다. 호재성 기사로 시장 기대를 키웁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팔고 떠납니다.
수사 대상은 일간지(경제지 포함) 기자, 인터넷 매체 기자 등 다양합니다. 기자 본인과 지인, 가족 등까지 포함해 2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선행매매를 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178조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 |
 지난 7일 KBS뉴스9
지난 7일 KBS뉴스9 ■ "1년 도 안돼 5억 이상"
A 기자는 지난 2023년 한 코스닥 상장사가 삼성 계열사에 특정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에 [단독]도 붙였습니다. [단독] 머리말이 붙으면, 더 많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읽히기 쉽습니다.
문제의 [단독] 기사가 출고된 당일, 해당 상장사 주가는 30% 급등합니다. 보름 전과 비교해 보면 100%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기자가 상장사 10여 개를 대상으로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고, 정보 취재와 기사 출고의 시차를 노린 선행매매로 5억 원 넘는 부당이익을 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KBS 뉴스9
지난 7일 KBS 뉴스9금감원이 의심하는 A 기자의 선행매매 기간은 2023년 7월 13일~2024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주식 투자로 5억 원 이상 벌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잡코리아'에서 A 기자 소속 언론사의 평균 연봉을 찾아봤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A 기자는 직장 동료들보다 평균 10배를 벌었단 얘기가 됩니다.
이쯤 되면 기자일까요, 전업 투자자일까요.
A 기자는 올해 초 사표를 썼습니다. 기자를 그만둔 뒤로도 놀라운 수익률을 유지할지 궁금해집니다.
■ 금융당국 "특징주 기사에 주목"
금융당국은 기자들이 주로 '특징주'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면서, 선행매매에 빠져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란 특정 거래일이나 특정 기간 주가나 거래량에서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을 말합니다. 포털에는 매일 같이 '특징주'가 쏟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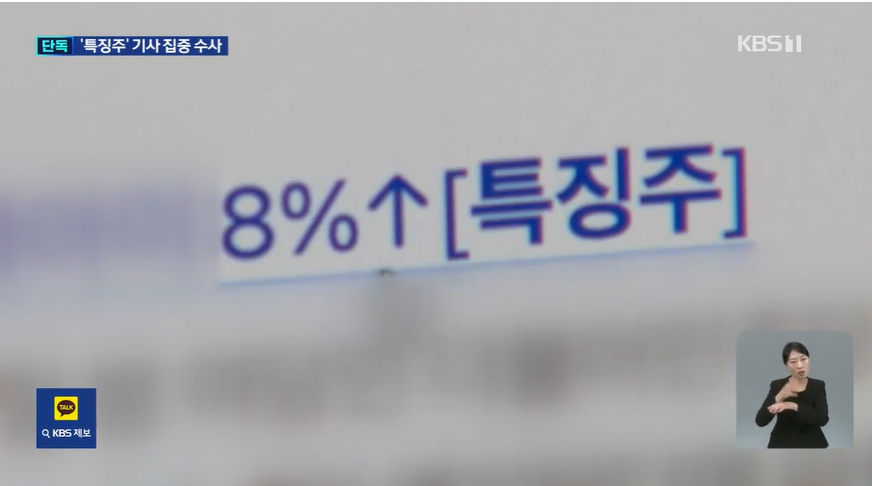 지난 7일 KBS뉴스9
지난 7일 KBS뉴스9금융당국이 특징주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 취재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재도 비교적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정보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선행매매를 한다는 의심입니다.
둘째, 특징주 기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특징주 기사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떠돌아다닙니다. 속칭 '지라시' 형태로 퍼지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유인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종목도 특징주 기사로 다뤄지면, 그럴싸하게 포장됩니다. '이제라도 사야 하나'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지난 7일 KBS 뉴스9
지난 7일 KBS 뉴스9■ 함구령 또는 사내 교육
KBS가 선행매매 수사를 연달아 보도한 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에선 이번 사건이 단골 이야기 주제가 된 듯합니다.
몇몇 언론사는 기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했다고 하고, 기자 두 명이 연루된 한 일간지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는 이번 사건 때문에 퇴사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 기자는 "왜 퇴사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선배가 알고 보니 이번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친한 지인에게 종목을 추천하던 모습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이 친한 취재원에게 "이 종목 곧 오를 거니 사두세요."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들은 "특징주 기사 쓰는 게 두렵다"는 말도 합니다. 특징주 기사 작성 전후로 해당 주식을 사고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선행매매 혐의는 극히 일부의 기자에 한정됩니다. 열심히 취재하고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증권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분위기도 전보다 커졌습니다.
호재가 정말 호재가 맞는지, 추진한다는 신사업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 건지…
더 묻고 더 따져본 뒤 기사 쓰는 기자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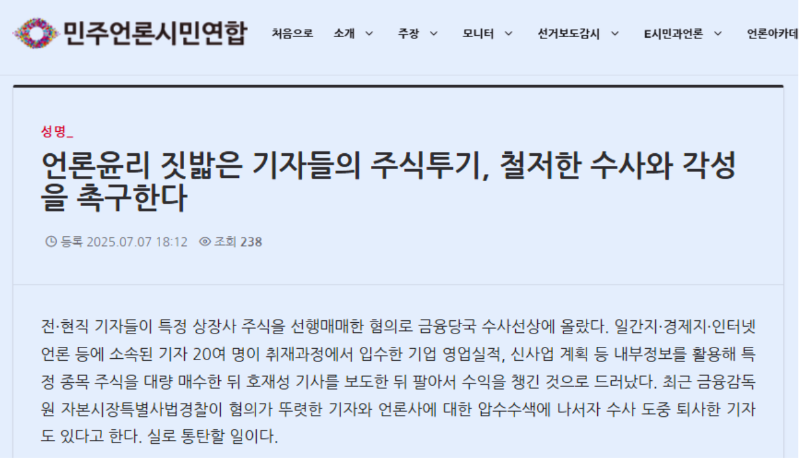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발표한 성명 중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발표한 성명 중 일부■ 침묵, 또 침묵…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KBS 보도에 달린 댓글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언론사는 많지 않습니다.
17일 현재까지 서울신문, 한겨레, 이데일리, 미디어오늘 등 소수 매체만 기자 선행매매 수사를 다뤘습니다.
이 정도로 사소한 사건인가? KBS만 중뿔난 걸까? 금융업계 취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감원 사람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나 부도덕성에 비하여 언론 보도가 매우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 언론사들이 쓴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주며 "그래도 이 언론사는 써주네요."라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평소 언론인 주식 투자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외국의 유수 언론은 자율규제가 도입된 걸로 안다. 증권 분야 종사자들처럼 언론들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도입돼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업자라는 이유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기자의 선행매매 혐의를 비판했습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 "언론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계가 윤리와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식으로 1년에 5억…그 ‘기자’들이 사는 세상
-
- 입력 2025-07-19 06:00:45

금융당국이 일부 기자들을 '털고' 있습니다.
기자 본인과 가족, 지인의 주식 계좌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속칭 '꾼'을 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주식으로 해 먹으려는 자를 쫓는 수사는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추격 대상이 전·현직 언론사 직원들입니다.
[다시 보기]
[단독]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기자 20여 명 수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6018
[단독]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 개 뒤진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7743
[단독] 기자 선행매매 혐의 수사 확대…종목·수법 더 늘 듯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8422&ref=A
■ 선행매매를 아십니까
'아, 그때 샀더라면…' 혹은 '그때 팔지 말 걸…'
SK하이닉스 주가 그래프를 보면, 적잖은 이가 이런 후회를 할 겁니다. 십분 이해되지만, 부질없는 후회기도 합니다. 주식 매매의 타이밍이란 게 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확신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습니다.
남들이 사기 전에 먼저 사들입니다. 왜? 확실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튀어 오르면 재빨리 팔고 나갑니다.
한 발 먼저 치고 빠지기, 바로 '선행매매'입니다.
다수의 기자가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가 선행매매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이 의심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파악하자 해당 주식을 매수합니다. 호재성 기사로 시장 기대를 키웁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팔고 떠납니다.
수사 대상은 일간지(경제지 포함) 기자, 인터넷 매체 기자 등 다양합니다. 기자 본인과 지인, 가족 등까지 포함해 2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선행매매를 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178조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 |

■ "1년 도 안돼 5억 이상"
A 기자는 지난 2023년 한 코스닥 상장사가 삼성 계열사에 특정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에 [단독]도 붙였습니다. [단독] 머리말이 붙으면, 더 많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읽히기 쉽습니다.
문제의 [단독] 기사가 출고된 당일, 해당 상장사 주가는 30% 급등합니다. 보름 전과 비교해 보면 100%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기자가 상장사 10여 개를 대상으로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고, 정보 취재와 기사 출고의 시차를 노린 선행매매로 5억 원 넘는 부당이익을 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의심하는 A 기자의 선행매매 기간은 2023년 7월 13일~2024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주식 투자로 5억 원 이상 벌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잡코리아'에서 A 기자 소속 언론사의 평균 연봉을 찾아봤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A 기자는 직장 동료들보다 평균 10배를 벌었단 얘기가 됩니다.
이쯤 되면 기자일까요, 전업 투자자일까요.
A 기자는 올해 초 사표를 썼습니다. 기자를 그만둔 뒤로도 놀라운 수익률을 유지할지 궁금해집니다.
■ 금융당국 "특징주 기사에 주목"
금융당국은 기자들이 주로 '특징주'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면서, 선행매매에 빠져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란 특정 거래일이나 특정 기간 주가나 거래량에서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을 말합니다. 포털에는 매일 같이 '특징주'가 쏟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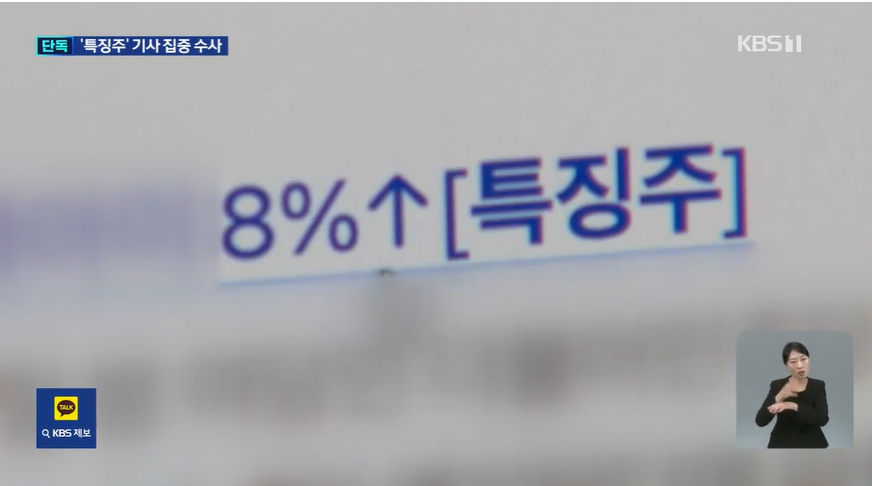
금융당국이 특징주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 취재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재도 비교적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정보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선행매매를 한다는 의심입니다.
둘째, 특징주 기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특징주 기사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떠돌아다닙니다. 속칭 '지라시' 형태로 퍼지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유인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종목도 특징주 기사로 다뤄지면, 그럴싸하게 포장됩니다. '이제라도 사야 하나'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함구령 또는 사내 교육
KBS가 선행매매 수사를 연달아 보도한 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에선 이번 사건이 단골 이야기 주제가 된 듯합니다.
몇몇 언론사는 기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했다고 하고, 기자 두 명이 연루된 한 일간지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는 이번 사건 때문에 퇴사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 기자는 "왜 퇴사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선배가 알고 보니 이번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친한 지인에게 종목을 추천하던 모습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이 친한 취재원에게 "이 종목 곧 오를 거니 사두세요."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들은 "특징주 기사 쓰는 게 두렵다"는 말도 합니다. 특징주 기사 작성 전후로 해당 주식을 사고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선행매매 혐의는 극히 일부의 기자에 한정됩니다. 열심히 취재하고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증권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분위기도 전보다 커졌습니다.
호재가 정말 호재가 맞는지, 추진한다는 신사업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 건지…
더 묻고 더 따져본 뒤 기사 쓰는 기자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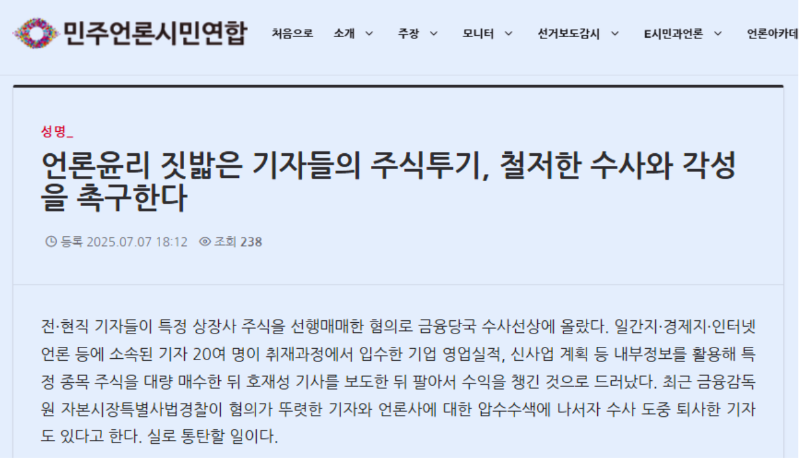
■ 침묵, 또 침묵…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KBS 보도에 달린 댓글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언론사는 많지 않습니다.
17일 현재까지 서울신문, 한겨레, 이데일리, 미디어오늘 등 소수 매체만 기자 선행매매 수사를 다뤘습니다.
이 정도로 사소한 사건인가? KBS만 중뿔난 걸까? 금융업계 취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감원 사람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나 부도덕성에 비하여 언론 보도가 매우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 언론사들이 쓴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주며 "그래도 이 언론사는 써주네요."라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평소 언론인 주식 투자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외국의 유수 언론은 자율규제가 도입된 걸로 안다. 증권 분야 종사자들처럼 언론들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도입돼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업자라는 이유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기자의 선행매매 혐의를 비판했습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 "언론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계가 윤리와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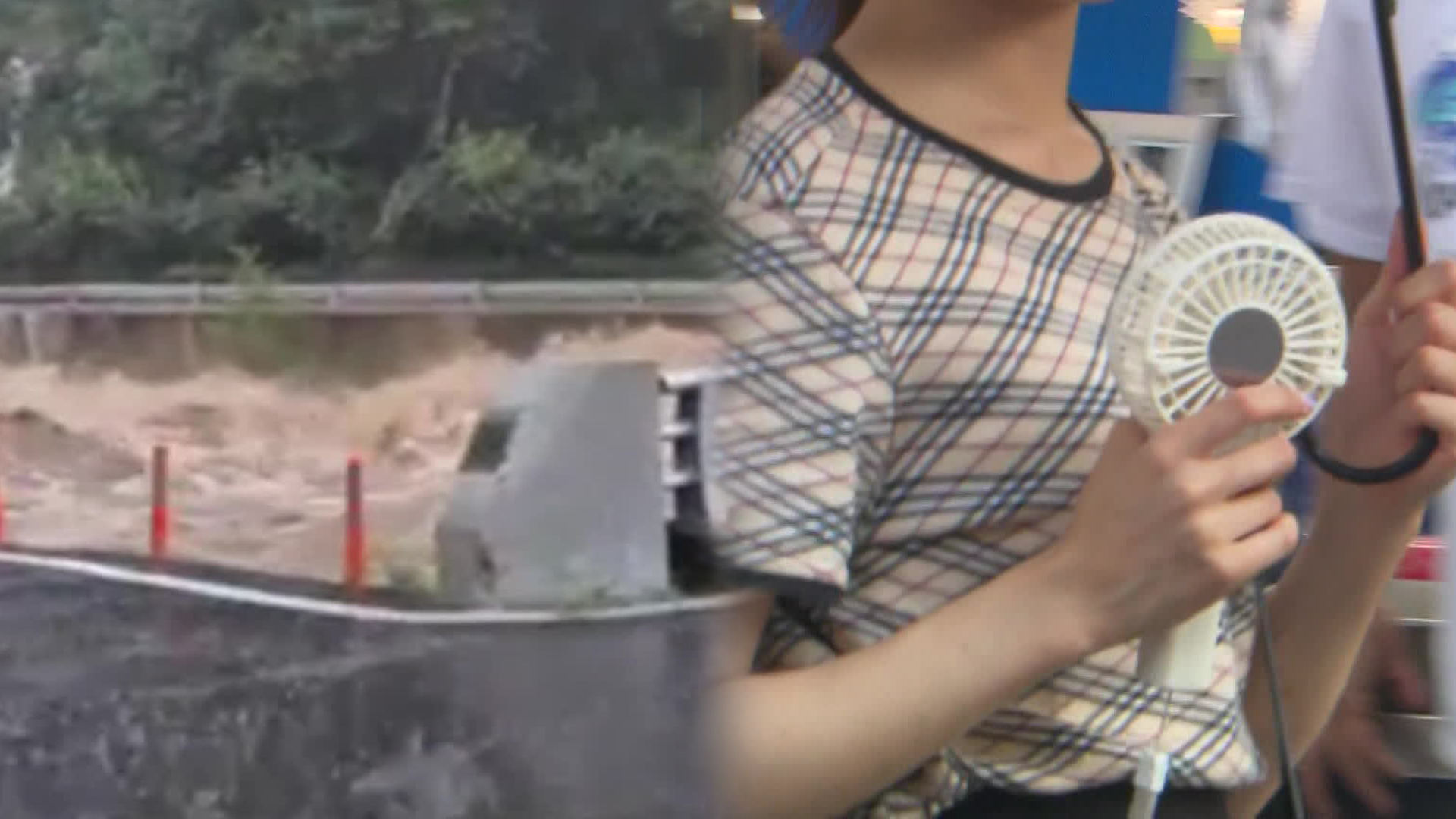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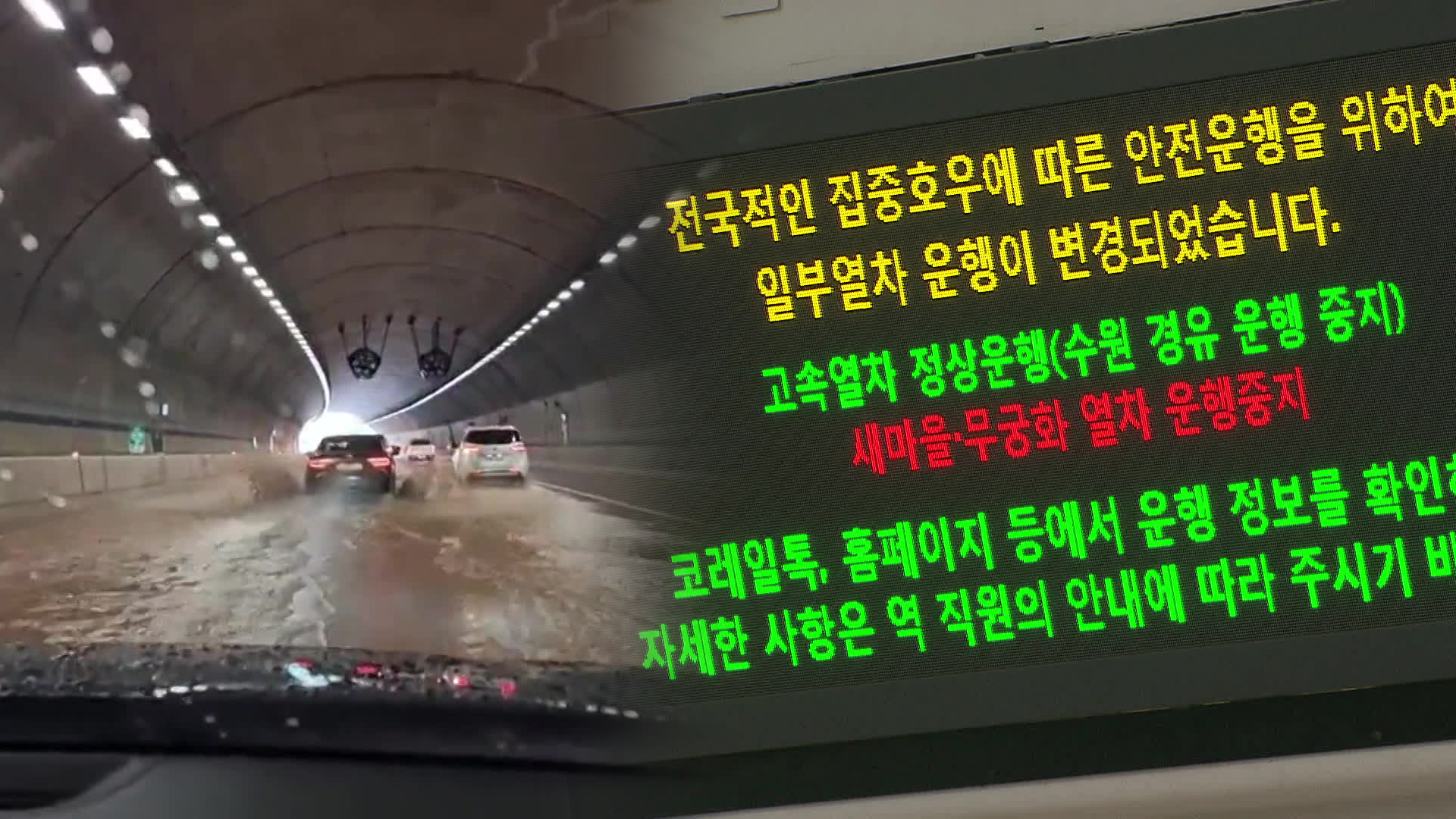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